그날의 소년이 당신에게
- 소년이 온다
- 글 건설환경공학부 1 이찬서
- 편집 건축학과 4 김찬
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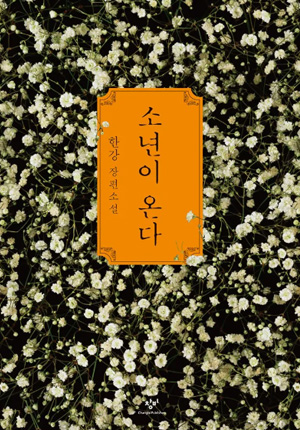
2024년, 한강 작가는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으며 세계 문학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가 선보인 작품, 「소년이 온다」는 잔혹한 역사와 인간의 아픔을 뛰어난 서사로 엮어낸 작품으로, 노벨의 영예를 한층 더 빛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과 깊은 성찰을 선사하며, 한강 작가가 왜 전 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작품 속 활자만으로 작가가 의도했던 역사 속 가슴 아픈 현실을 전부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책을 읽으며 역사의 잔혹함만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힘겹게 꺼낸 사람들의 목소리는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네주고 있을까요?
그날의 소년들
「소년이 온다」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와 그 이후 지속되는 여러 가지 고통을 다양한 인물의 시점으로 재구성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각 장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소설의 시점은 모두 다르게 구성되어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다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소설 속 중심 인물이자 중학교 3학년인 동호와 그의 친구 정대, 그리고 함께 시신 수습 일을 하던 시민군 진수, 여고생 은숙과 선주, 마지막으로 동호의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인물들입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동호는 계엄군에 의한 친구 정대의 죽음을 목격하고, 시신들이 수습되고 있는 장소인 도청으로 향합니다. 동호는 시청에서 시신 수습을 돕게 되고, 은숙, 진수, 선주를 만나게 됩니다. 시위를 하던 사람들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오는 일이 매일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반복되어도 동호는 묵묵히 자신이 맡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동호도 친구 정대의 죽음을 잊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친구를 두고 도망친 것만 같은 죄책감과 어린 중학생의 두려움이 공존하는 복잡한 심경을 책을 읽는 내내 생생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동호와 함께 도청에서 일을 하다 계엄군에게 잡혀가 끔찍한 고문을 겪고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민군 진수, 그리고 살아남았지만 트라우마와 죄책감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고등학생 은숙과 선주,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어렸던 정대와 동호를 그리워하는 동호 어머니의 이야기들이 각 장마다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불과 45년 전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그리고 아직도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원망스러울 정도입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고통 속으로 이끌었을까요? 그들이 분명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음에도 행동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수십만 사람들의 피가 모여 이룬 거대한 혈관
"양심. 그래요, 양심.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그겁니다. (114p)"
시민군 김진수와 함께 계엄군에게 고문당한 사람의 말입니다. 그는 진수의 죽음에 대해 증언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수십만 사람들과 함께 총구 앞에 섰던 날, 느닷없이 발견한 내 안의 깨끗한 무엇인가에 놀랐습니다. 더이상 두렵지 않다는 느낌, 지금 죽어도 좋다는 느낌, 수십만 사람들의 피가 모여 거대한 혈관을 이룬 것 같았던 생생한 느낌을 기억합니다. 그 혈관에 흐르며 고동치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의 맥박을 나는 느꼈습니다. 감히 내가 그것의 일부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가 말하는 깨끗한 무엇이 바로 양심일 것입니다.
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로부터 한 가지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다들 자신들이 계엄군의 무기와 병력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있었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호와 은숙, 선주는 끝까지 도청 상무관1)을 지켰으며, 진수는 시민군으로서 계엄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의 맥박을, 자신들이 그 일부임을 느꼈을까요?
그렇게 양심에 따라 행동한 모든 사람은 안타깝게도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목숨을 잃기도 하고, 고문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그들을 괴롭힙니다. 진수는 계엄군에게 붙잡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고문을 받게 됩니다. 고문을 받고 난 뒤 돌아오는 식사 시간에는 2인 1조로 식판에 담긴 밥 한 줌과 쉰 콩나물국과 김치를 나눠 먹습니다.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도 같은 시민군 동지끼리 눈치를 보며 서로 증오하게 만드는 정신적 고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죠. 진수의 죽음에 대해 증언하는 그는 바로 진수와 같이 밥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그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치욕적인 허기 속에서 쉰 콩나물을 씹던 순간들이 삶이었다면, 죽음은 그 모든 걸 한 번에 지우는 깨끗한 붓질 같은 것이리라고.' 끔찍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생존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보다 살아있음을 치욕스러운 고통으로 여깁니다. 1980년대 고문 피해에 대한 증언 요청을 받은 2000년대의 선주도 증언을 거부하며, 그와 마찬가지로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도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갈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역사였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겠으나, 이를 무시하는 듯한 2024년의 겨울은 많은 사람들의 잊고 싶은 상처에 또 다른 아픔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숭고한 심장을 다시 뛰게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년이 온다」를 읽으며 오늘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세상을 마주해야 할까요?
물이 나와서는 안 되는 분수대
"어떻게 벌써 분수대에서 물이 나옵니까. 무슨 축제라고 물이 나옵니까.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벌써 그럴 수 있습니까. (69p)"

분수대는 시민군이 거점으로 삼아 계엄군에게 저항하던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이 피 흘리며 목숨을 잃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1980년의 5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분수대에서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19살의 은숙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위의 구절은 소설 속에서 은숙이 직접 도청 민원실에 전화하여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물이 나오는 분수대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 잊고 이젠 공부를 해요.'라는 말이었습니다.
잊으라는 말. 이 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숙은 분수대에서 나오는 물을 '용서할 수 없는 물줄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녀에게 분수대에서 나오는 물은 쉽게 잊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책에 등장하는 다른 구절을 빌리자면 '어떤 기억은 아물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억이 흐릿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기억만 남기고 다른 모든 것이 서서히 마모됩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그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용서할 수 없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물지 않는 기억뿐이라 그 고통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히 그들에게 잊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아물지 않는 상처에 더 깊은 칼을 꽂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닌 고통을 이해하고 나누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잊지 않으며, 그날의 기억이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마무리하며
5·18 민주화운동은 훼손되어서도, 절대 잊혀서도 안 되는 역사입니다. 「소년이 온다」는 그 아픈 역사 속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거대한 고통과 트라우마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렵게 우리에게 건네는 이야기입니다. 독자 여러분도 이 작품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돌아보고, 당시의 비극과 함께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날의 기억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비록 시간이 흘렀어도, 우리가 그날의 아픔과 진실을 계속 기억한다면, 이는 곧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번 기사를 통해 「소년이 온다」라는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요즘 한강 작가의 명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공대상상 독자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부담 없이 그의 작품 세계에 발을 들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강 작가가 전하는 깊이 있는 서사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감동과 깨달음을 선사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발걸음이 독자 여러분을 '햇빛이 있는 곳으로, 꽃이 핀 곳으로' 이끌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
- 1) 5·18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들의 주검을 임시 안치하였던 장소.
참고 문헌
- 박숙자. (2022). '5·18 이후'의 문학: 고통과 책임: 「소년이 온다」(한강)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22(1), 45-75.
- 정현주. (2023). 공유기억의 장치로서의 문학과 기억의 윤리: 「소년이 온다」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23(3), 77-105.
- 이수민. (2024.10.20). '노벨문학상' 소년이 온다 그곳?...한강 소설 속 '광주 여행'. 뉴스1. https://www.news1.kr/local/gwangju-jeonnam/5572838